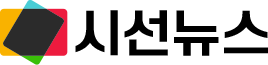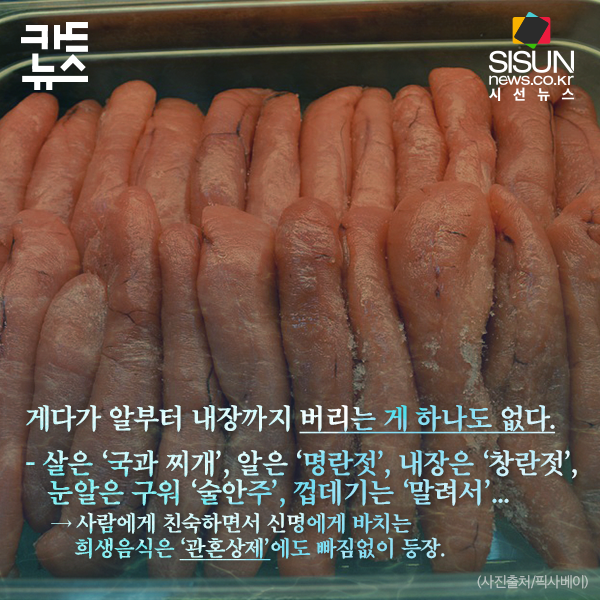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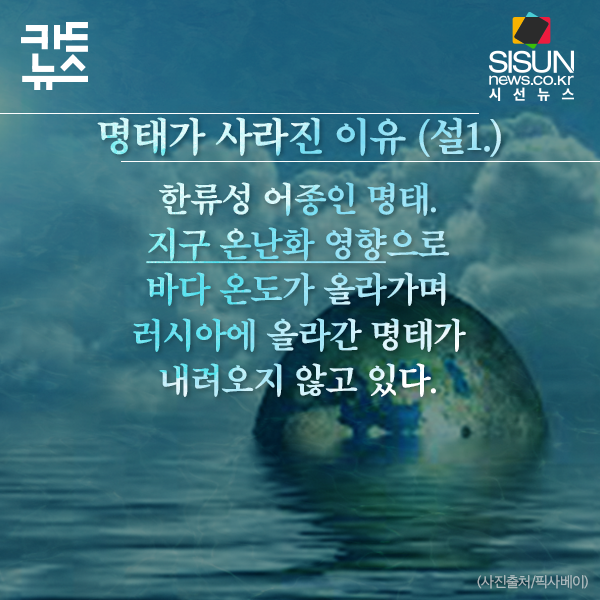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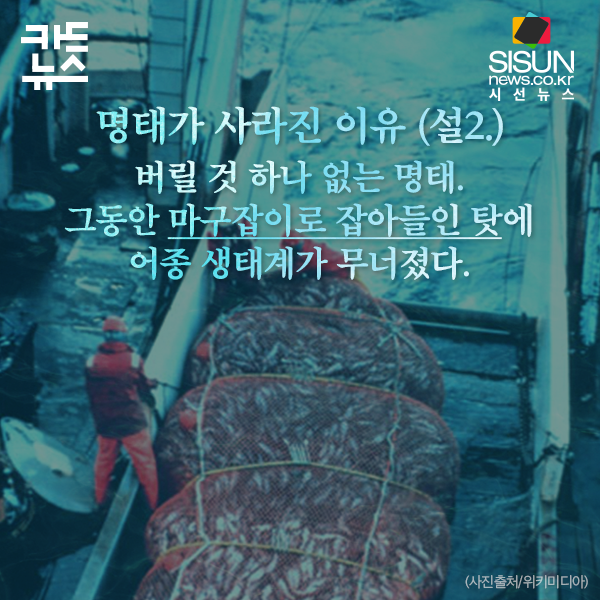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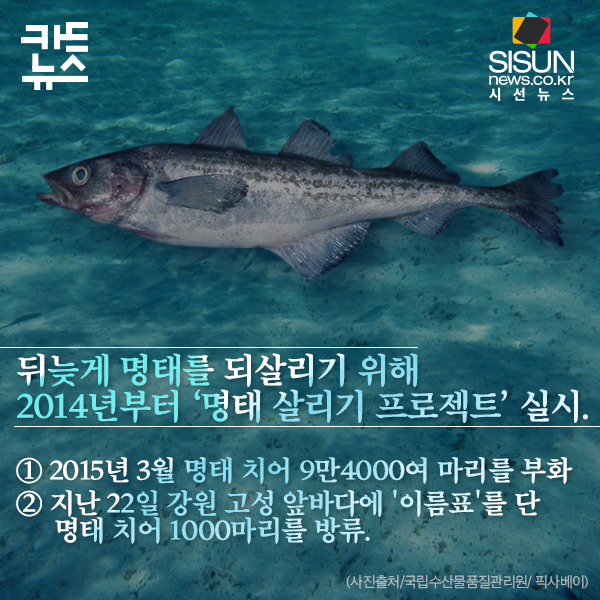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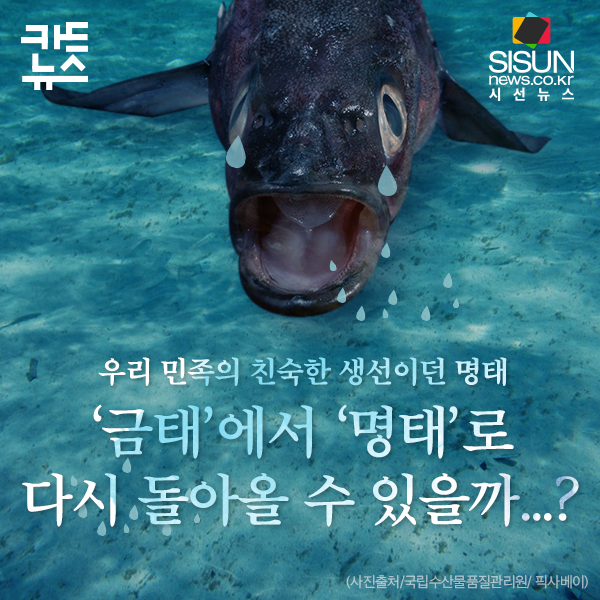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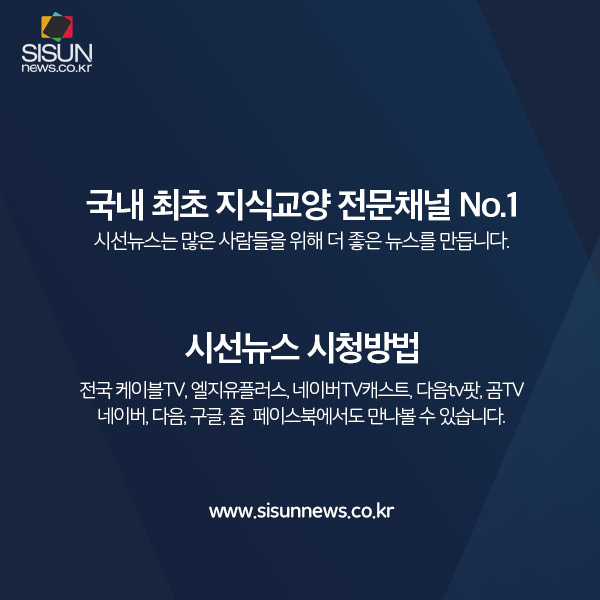
[시선뉴스 심재민기자 /이정선 pro] 동해바다에 풍족하게 모여 살던 명태. 하지만 명태는 이제 더 이상 동해에서 쉽게 볼 수 없게 되었다...명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동해바다에 풍족했던 명태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자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친숙했던 명태는 지역과 가공법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 이름도 다양했다.
강원도에서는 ‘강태’, 간성에서는 ‘간태’, 러시아 산과 구별하기 위해 ‘진태’, 막 잡은 놈은 ‘생태’, 잡아 얼리면 ‘동태’, 말린 것은 ‘북어(건태)’ 배를 가르면 ‘짝태’, 겨울 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노랗게 변하면 ‘황태’, 코를 꿰어 반 건조 한 것은 ‘코다리’, 새끼 명태는 ‘노가리’, 3~4월에 잡히면 ‘춘태’, 음력 4월에는 ‘사태’, 5월에는 ‘오태’까지 명태의 이름은 35가지나 된다. (자료/국립수산 과학원)
명태는 알부터 내장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다. 살은 ‘국과 찌개’, 알은 ‘명란젓’, 내장은 ‘창란젓’, 눈알은 구워서 ‘술안주’, 껍데기는 ‘말려서’먹기도 했다.또한 사람에게 친숙하면서도 신명에게 바치는 희생음식은 어느 한 군데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동서고금의 불문율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관혼상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 외 인색한 사람의 행동을 조롱할 때 ‘명태 만진 손 씻은 물로 사흘을 국 끓인다.’라는 표현과 변변치 못한 것을 주고는 큰 손해를 입힌다는 뜻의 ‘북어 한 마리 주고 제사상 엎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동해에 풍족하던 친숙한 명태는 이젠 귀한 생선이 된지 오래 되었다. 참고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명태의 대부분이 러시아산이다. 국내 명태 어획량은 1970년대 10만t, 1980년대 7만4000t 수준이었는데 점점 줄어, 2008년에는 공식 어획량이 0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바다에서 잡힌 명태는 3t에 그쳤다. 동해에서 명태가 씨가 마르면서 이름이 하나 추가되는데, 귀해서 ‘금태’이다.
명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명태는 한류성 어종으로, 가을에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한류를 타고 내려오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러시아에 올라간 명태가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다.
두 번째는 “명태는 알로 만든 ‘명란젓’부터 술안주용 ‘노가리’(새끼 명태)까지 치어, 성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탓에 어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다.
뒤늦게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2015년 3월에는 명태 치어 9만4000여 마리를 부화시켰으나 30일 만에 모두 폐사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자취를 감춘 명태의 동해안 서식 여부, 회유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원 고성 앞바다에 '이름표'를 단 명태 치어 1000마리를 방류했다.
동해에 살며 우리 민족의 친숙한 생선이던 명태, ‘금태’에서 ‘명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