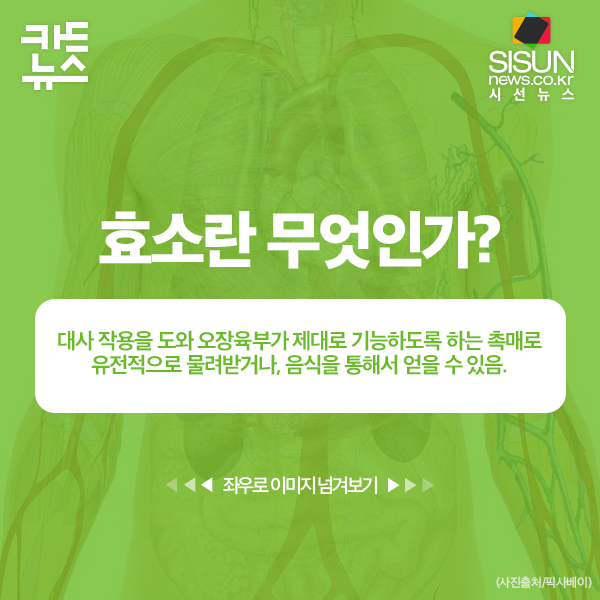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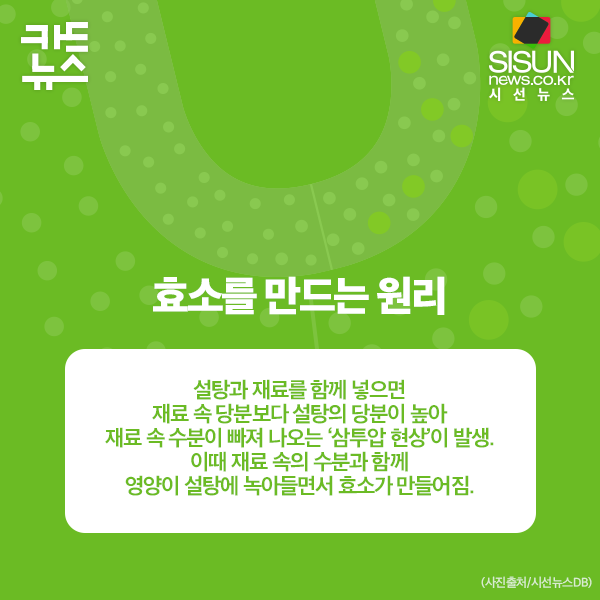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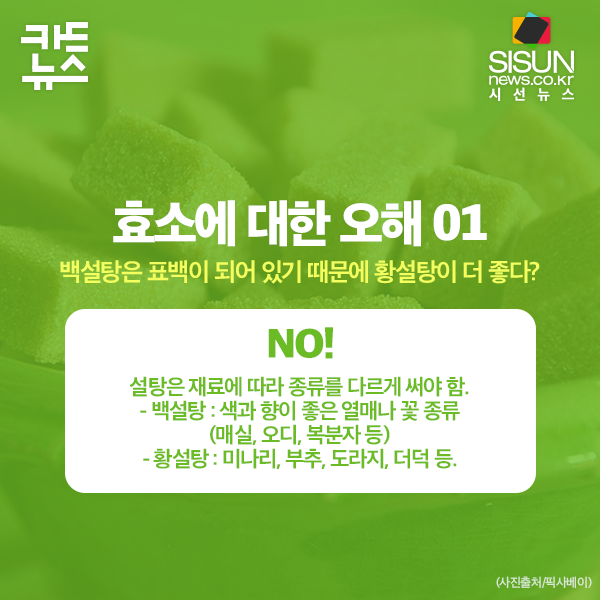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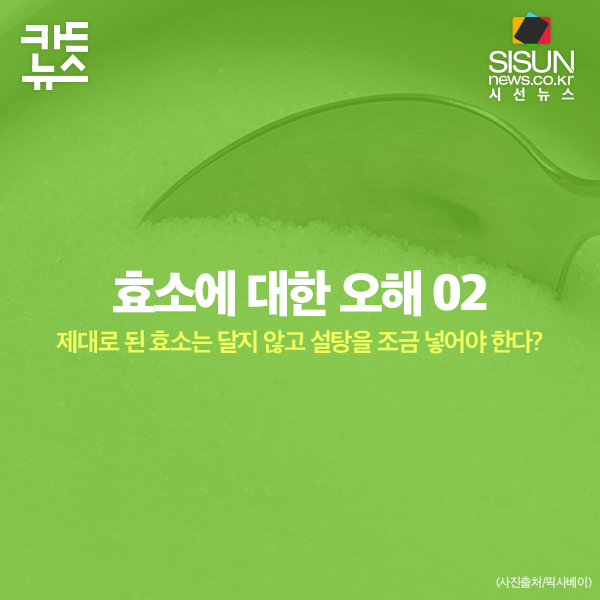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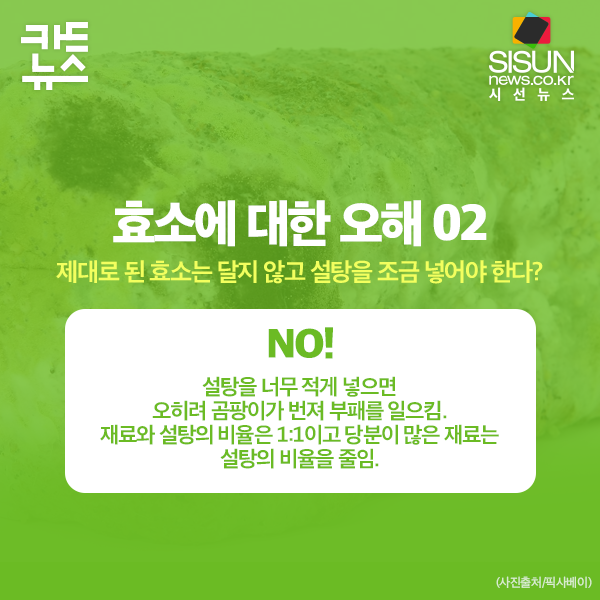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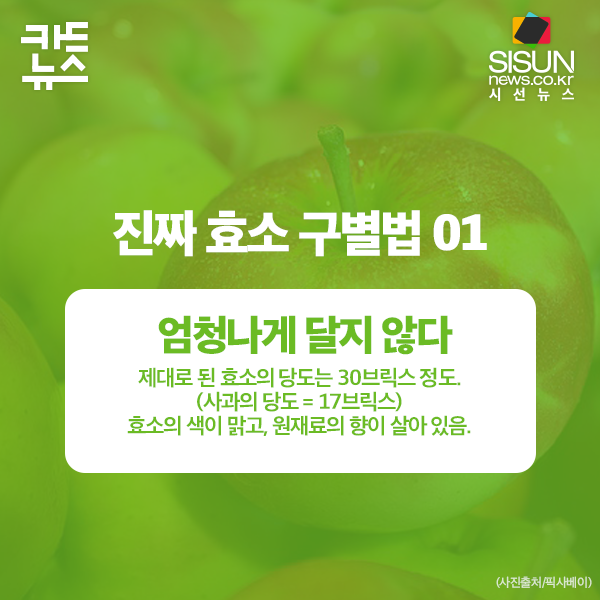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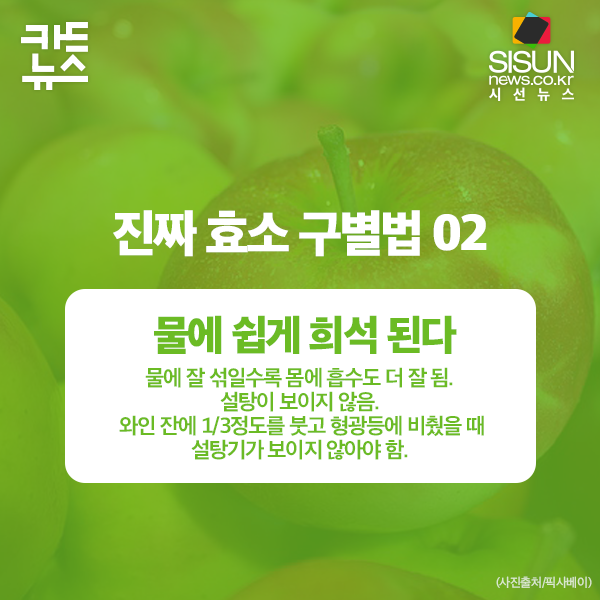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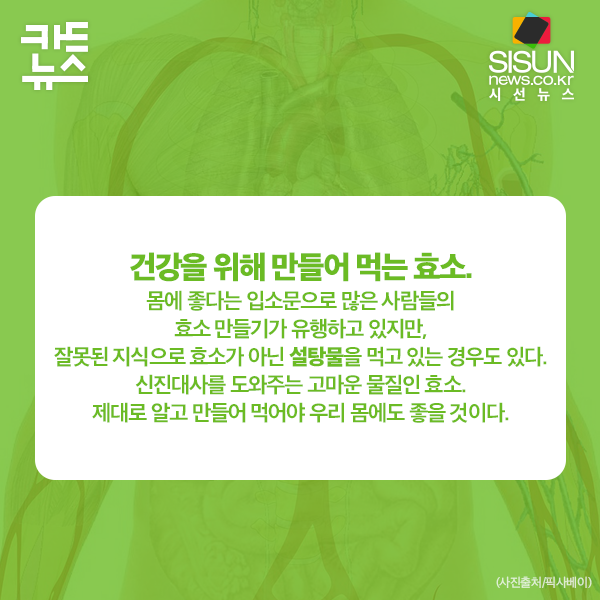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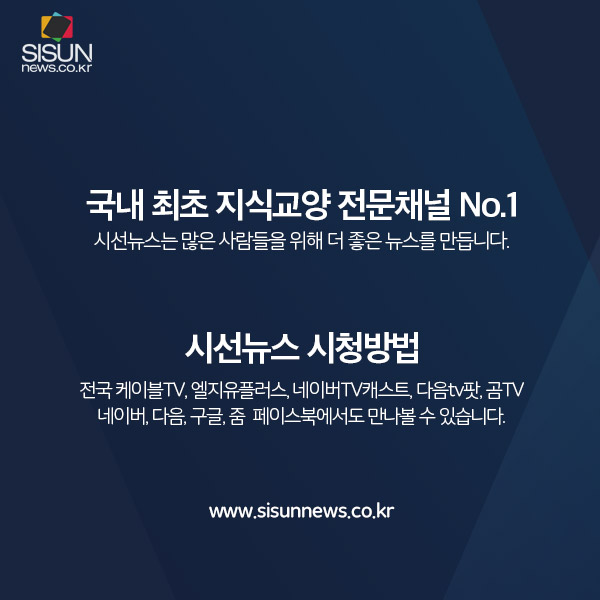
[시선뉴스 이호기자, 이승재 인턴 / 디자인 이연선 pro]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면서 직접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매실, 오미자, 복분자 등을 이용해 ‘효소’를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만들기 쉬운 만큼 제대로 만든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는 효소, 정말 제대로 만드는 것일까? 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효소란, 대사 작용을 도와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체내의 효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지는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얻는다.
효소는 열에 약해 5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익힌 음식을 통해서는 소량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 체내에서 효소를 생산해내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효소가 줄어들게 되면 위, 간 등의 장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체에 병이 생기게 되므로 따로 효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만드는 효소는 삼투압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효소를 만들 원재료와 설탕을 섞어서 만드는데, 재료 속 당분보다 설탕의 당분이 높아 재료 속의 수분이 빠져나오게 된다. 이 때 재료 속의 수분과 함께 영양성분이 섵탕에 녹아들면서 효소가 만들어 진다.하지만 우리가 효소를 만들 때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효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로는 흔히 백설탕과 황설탕 중 사람들은 황설탕이 더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백을 한 백설탕보다는 아무래도 황설탕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인식인데 효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설탕은 재료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진다. 흔히 매실, 오디, 복분자 등 향과 색이 좋은 열매나 꽃 종류에는 백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미나리, 부추, 도라지 등의 재료에는 황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효소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오해로는 제대로 된 효소는 달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효소의 특징일 뿐 설탕이 조금 들어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설탕을 적게 넣으면 곰팡이가 번져 발효가 아닌 부패가 일어난다. 따라서 재료와 설탕의 비율은 1:1정도가 적당하고 재료에 당분이 많다면 조금 덜 넣거나 적으면 더 넣어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효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만든 효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매우 달지 않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효소의 당도는 30브릭스(당을 측정하는 단위)정도로 17브릭스 정도의 사과보다 약 두 배 정도의 당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는 효소의 색이 맑고 원재료의 향이 살아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물에 쉽게 희석이 되어야 한다.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은 몸에도 잘 흡수 된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설탕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설탕이 보이는 것은 제대로 된 효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설탕물이다.
건강을 위해 만들어 먹는 효소. 몸에 좋다는 입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의 효소 만들기가 유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효소가 아닌 설탕물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고마운 물질인 효소. 제대로 알고 만들어 먹어야 우리 몸에도 좋을 것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